|
|
한국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불교와 유교의 양식이 혼합된 상례가 행하여졌으나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들어오고 조선 전기에는 배불숭유(排佛崇儒)를 강행한 영향 등으로
불교의식은 사라지고 유교의식만이 행하여졌다.
《주자가례》는 중국의 풍습을 주로 한 것이어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대목이 많아 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거듭되었고 한국에 맞는 예문(禮文)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숙종 때 이재(李縡)가 엮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상례를 알맞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이에 따랐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례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지방마다 풍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현대에는 불교 그리스도교 등의 종교의식에
의한 상례가 혼입되고 매사에 간략화를 추구하는 현대풍조로 인하여 상례도 많이 변모하였다.
상례는 크게 나누어 초종(初終), 습(襲)과 소렴(小殮) 대렴(大殮), 성복(成服), 치장(治葬)과 천구(遷柩),
발인(發靷)과 반곡(反哭), 우제(虞祭)와 졸곡(卒哭), 부()와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祭)와 길제(吉祭),
사당(祠堂) 묘제(墓祭)의 9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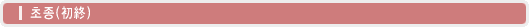 |
| |
임종에서 습까지의 절차 |
|
| |
| 속광(屬) |
고운 솜을 죽어가는 사람의 코나 입에 대어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운명이
확인되면 남녀가 모두 곡을 한다. |
| 복(復) |
초혼이라고도 한다. 사자의 흐트러진 혼을 불러들인다는 뜻이다. 사자가 평소에 입던
홑두루마기나 적삼의 옷깃을 잡고 마당에 나가 마루를 향하여 사자의 생시 칭호로 ‘모(某) 복복복’ 3번
부른 다음 그 옷을 시체에 덮고 남녀가 운다. 또한 이때 ‘사자밥’이라 하여 밥 세 그릇, 짚신 세 켤레,
동전 세 닢을 채반에 담아 대문 밖 옆에 놓는다. |
| 천시(遷屍) |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뜻에서 생전에 고인과 가까웠던 친구가 한다. |
| 입상주(立喪主) |
부모상에는 장자가 주상(主喪)이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된다.
아들이 죽었을 때는 부친이,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주상이 된다. |
| 호상(護喪) |
친구 또는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을 상례(相禮)라 하여 상례 일체를 맡아보게 하고
예에 통하고 활동력 있는 사람을 호상으로 내세워 상례를 돕게 한다. |
| 복(服) |
유복자(有服者)가 모두 화려한 옷을 벗고 사자의 처 자녀 자부는 모두 머리를 풀고
아들들은 맨발로 백색의 홑두루마기를 입되 소매를 걷어서 왼쪽 어깨를 드러낸다. |
| 전(奠) |
신(神)이 의빙(依憑)하게 하는 것으로 매일 1번씩 생시에 쓰던 그릇에 술 미음 과일
등을 식탁에 놓아 시체 동쪽으로 어깨 닿는 곳에 놓는다. |
| 고묘(告廟) |
무복자(無服者)를 시켜 사당 밖에서 ‘○○질불기감고(某疾不起敢告)’라고
말로 고하게 한다.
사당이나 신주(神主)가 없는 가정에서는 이 절차는 생략된다. |
| 부고(訃告) |
부고는 호상의 이름으로 친척과 친지에게 알린다. |
| 치관(治棺) |
관을 만드는 일로, 통상 1치 정도의 옹이 없는 송판(松板)으로 만든다.
칠성판(七星板)도 송판으로 만들되 5푼이면 적당하고 판면에 구멍을 뚫어 북두칠성 모양으로 한다. |
| 설촉(設燭) |
날이 어두워지면 빈소 밖에 촛불을 켜고 마당에 홰를 지핀다.
빈소 안쪽에 장등(長燈)하는 것은 예가 아니며 화재의 염려도 있어 행하지 않는다. |
|
|
|
 |
| |
사자에게 일체의 의복을 갈아 입히는 절차를 습이라 한다.
먼저 남자의 옷으로는 적삼 ·고의 ·보랏빛 저고리 ·남빛 두루마기 ·바지 ·행전 ·버선 ·허리띠 ·대님 ·복건
·검은 공단 망건 ·멱모(帽:얼굴을 싸는 천) ·악수(幄手:손을 싸는 천) ·신(들메) ·심의(深衣) ·대대(大帶)
·조대(실로 짠 띠) ·충이(充耳:귀막이) 등을 마련하고, 여자의 옷으로는 적삼 ·속곳 ·보랏빛 저고리
·초록빛 곁마기 ·허리띠 ·바지 ·다홍치마 ·버선 ·검은 공단 모자 ·악수 ·신 ·원삼(圓衫) ·대대 ·충이
등을 준비한 다음 시신을 목욕시키고 두발은 감겨서 빗질하여 검은 댕기로 묶어 상투를 만든다.
얼굴을 가리고 발톱 ·손톱을 깎아서 준비된 주머니에 넣은 다음 심의(深衣)를 펴 놓고 먼저 준비된 옷을 입힌다.
이때 반함(飯含)이라 하여 찹쌀을 물에 불리었다가 물기를 빼고 버드나무 숟가락을 만들어 세 술을 시구(屍口)에
넣으면서 ‘천석이오’ ‘이천석이오’ ‘삼천석이오’ 하고 외친다.
소렴은 시신(屍身)을 칠성판 위에 올려 모시고 묶는 절차이다.
소렴이 끝나면 괄발(括髮)이라 하여 주인 ·주부가 머리를 삼끈으로 묶은 다음 삼끈 한 끝을 똬리처럼 틀고 두건을
쓰며 흰 옷에 중단을 입는다.
행전을 치고 복인은 모두 시체 앞에 곡을 한다. 다음 영좌(靈座)를 만들고 명정(銘旌)을 쓴다.
대렴은 시신을 모셔 입관하는 절차이다.
대렴이 끝나면 빈소 옆에 짚으로 여막(廬幕)을 짓되 크기는 반칸쯤 하고 천장과 3면을 가린 다음 바닥에는 거적을
펴놓고 그 위에 짚베개를 만들어 놓는다. 짚베개 앞에는 소방석(素方席)을 놓아 문상객의 조석(弔席)으로 하는데,
이렇게 여막을 짓는 것을 작의려(作倚廬)라고 한다.
대렴 후에는 대곡(代哭)을 그치고 조석곡(朝夕哭)을 한다. 일출시와 황혼에 곡하는데 이때는 배례(拜禮)는 하지 않고
다만 입곡(立哭)합니다.
습을 사망한 다음날 하면 소렴은 그 다음날, 대렴은 소렴 다음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은 대개 3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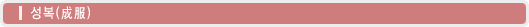 |
| |
대렴한 다음날 주인 ·주부 이하 유복자는 각각 복을 입으며 복자의 구분에
따라 상복을 입는다.
복은 사자와의 친소(親疏)의 구분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는데 참최(斬衰:父 ·長子 등)는 3년,
자최(齊衰:母 ·祖母 등) 3년, 자최장기(齊衰杖朞:남편 등) 13개월, 자최부장기(不杖朞:兄 ·姉 등) 13개월, 대공
(大功:從兄 ·從姉 등) 9개윌, 소공(小功:從祖父母 ·外祖父母 등) 5개월, 시마(麻:從曾祖父母 ·再從祖父母 등)
3개월 등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5복(五服)이라고 하며 상복도 재료가 다르다.
포(布)에서는 참최가 매우 성근 생포(生布), 자최는 약간 성근 생포, 대공은 약간 성근 숙포(熟布), 소공은 약간
가는 숙포, 시마는 매우 가는 숙포를 쓰고, 마(麻:삼)는 참최가 저마(麻:암삼), 자최 이하는 시마(麻:수삼),
시마는 숙마(熟麻)를 사용한다.
상복은 남자의 경우 관(冠:속칭 굴건) ·효건(孝巾:속칭 두건) ·의(衣:제복) ·상(裳) ·중의(中衣:中單衣)
·행전(行) ·수질(首) ·요질(腰) ·교대(絞帶) ·장(杖) ·이(履:짚신) 등으로 되어 있으며, 여자는 관(冠:흰 천으로
싼 족두리) ·의(衣) ·상(裳)을 입고 수질 ·요질 ·교대 ·장 등은 남자와 같으나 다만 요질에 산수(散垂)가 없다.
이(履)는 미투리를 신는다.
동자복(童子服)은 어른과 같으나 관 ·건 ·수질이 없다.
성복이 끝나면 조석으로 상식(上食)하며 상제들은 비로소 죽을 먹고 슬퍼지면 수시로 곡을 한다.
성복 전에는 손님이 와도 빈소 밖에서 입곡(立哭)하고 상제와의 정식 조문은 하고 있지 않다가 성복 후에 비로소
조례(弔禮)가 이루어진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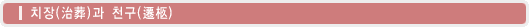 |
| |
치장은 장례를 위하여 장지(葬地)를 택하고 묘광(墓壙)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옛날에는 대부(大夫)는 3개월, 사(士)는 1개월 만에 장례를 거행하였으나 지금은 3일 ·5일 만에 거행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
|
| |
득지택일
(得地擇日) |
장지를 택하고 장사날을 정한 후 축(祝)이 조전(朝奠)할 때 영좌(靈座)에 고한다. |
| 결리(結裏) |
관(棺)을 싸고 다시 초석(草蓆)으로 싸서 가는 새끼줄로 묶는 절차이다. |
개영역
(開塋域) |
상주가 집사자(執事者)를 데리고 산지(山地)에 가서 묘혈(墓穴)에 표말을 세우고
간사를 시켜 산신에게 고하는 절차이다. |
| 천광(穿壙) |
무덤을 파는 일이며, 먼저 광상(壙上)에 묘상각(墓上閣)을 짓거나 차일(遮日)을 쳐서
비나 해를 가린 다음 천광한다. |
| 조주(造主) |
신주를 만드는 일이며, 재료는 밤나무를 사용하는데 높이는 약 24cm, 너비는 9cm 정도로
하고 밑에 받치는 부(趺)는 12cm, 두께는 3.5cm 가량으로 만든다. 요즈음은 신주를 만들지 않고 그때그때
지방(紙榜)을 써서 거행하는 사람이 많다.
다음 천구(遷柩)는 발인(發靷)하기 하루 전 먼저 가묘(家廟)에 고하는 절차를 끝내고 저녁 신시(申時)에
조전(祖奠)을 거행합니다.
다음날 아침 상식이 끝나면 영구를 옮긴다.
주인 이하가 곡하며 뒤따르고, 빈소에서
나올 때는 문 밖에 놓은 바가지를 발로 밟아 깨뜨린다. 재여(載轝)가 끝나면 혼백상자를 의자 위에 봉안하고
음식을 진설한 다음 주인 이하가 엎드리고 고축을 한다.
이것을 발인제라 한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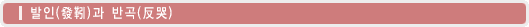 |
| |
발인은 사자가 묘지로 향하는 절차이다.
발인제가 끝나면 제물을 상여꾼에게 먹인 다음 장지로 향한다.
순서는 명정(銘旌) ·공포(功布) ·혼백(魂帛) ·상여(喪轝) ·상주 ·복인(服人) ·조객의 순으로 나간다.
중간에 친척집 앞을 지날 때는 노제(路祭)를 지내며 노제는 친척집에서 차린다. 또 가다가 개울이나 언덕이 있을 때는 정상(停喪)을 하는데 이때마다 복인들이 술값이나
담배값을 내놓는다.
|
|
| |
| 급묘(及墓) |
혼백과 상여가 도착하면 혼백은 교의(交椅)에 모시고 제물을 진설한다.
관은 광(壙) 가까이 지의(地衣)를 펴고 굄목을 놓은 뒤 그 위에 올려놓고 공포로 관을 훔치고 명정을 덮는다.
상주 이하 곡을 한다. |
| 폄 |
하관을 말한다. 상제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 |
| 증현훈(贈玄) |
현훈을 받들어 관 왼쪽 옆에 넣는 것인데 지금은 행하지않는다. |
| 가횡대(加橫帶) |
나무를 횡판으로 하여 5판 또는 7판으로 하되 매판 정면에 ‘壹貳參肆伍陸漆’이라
숫자를 명시하고 내광을 아래서부터 덮되 위로 부터 세번째 1장을 남겼다가 현훈을 드린 뒤 상주 이하가
2번 절하고 곡할 때 덮는다.
그 다음 회(灰)를 고루 펴서 단단히 다지되 외금정(外金井)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
| |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
| |
외광 앞쪽에 지석(誌石)을 묻는다.
지석은 석함이나 목궤에 넣는다. |
| 제주(題主) |
신주에 함중(陷中)과 분면(粉面)을 써서 교의에 봉안하고 혼백과 복의(復衣)는
신주 뒤로 둔다.
그러나 신주를 모시지 않는 가정에서는 지방으로 대신한다. |
| 설전(設奠) |
제주전(題主奠)이라 한다. |
| 성분(成墳) |
봉분을 만드는 일이다.
높이는 대개 4자 정도로 하고 묘 앞에는 묘표를 세우며 석물(石物)로는 혼유석(魂遊石)·상석(床石)·향로석을
차례로 배치하고 망주석(望柱石) 2개를 좌우에 세운다. |
|
|
|
| |
 |
|
| |
반곡(反哭)은 본가로 반혼(反魂)하는 절차이며 반우(反虞)라고도 한다.
곡비(哭婢)가 앞서가며 다음에 행자(行者)가 따르고 그 뒤에 요여(腰轝)가 가며 상제들은 그 뒤를 따른다.
본가에 도착할 때는 망문(望門), 즉 곡을 한 뒤에 축이 신주를 영좌에 모시고 혼백은 신주 뒤에 둔다.
주인 이하는 대청에서 회곡(會哭)하고 다시 영좌에 나아가 곡하며 집에 있던 사람들은 2번 절을 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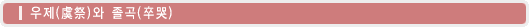 |
| |
사자의 시체를 지하에 매장하였으므로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우제를 거행하여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우제는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가 있는데 초우제는 반드시 장일(葬日) 주간(晝間)에 거행하며,
재우는 초우제 뒤에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일인 유일(柔日)에 행하고, 삼우는 재우를
거행한 후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일인 강일(剛日)에 행한다.
그러나 신주를 조성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장일에 지방으로 안신전(安神奠)을 거행하여 초우제를 대신하고 재우와
삼우는 폐지한다.
졸곡(卒哭)은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뜻이며 삼우를 지낸 후 강일에 거행한다.
요즈음은 3일 ·5일 ·7일 등으로 장일을 당겨 지내므로 우제는 여기에 맞추어 지내지만 졸곡만은 3개월안에 지내야 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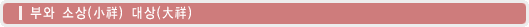 |
| |
부는 졸곡을 지낸 다음 날 거행하는 것으로 사자를 이미 가묘에 모신
그의 조(祖)에게 부하는 절차이다.
주인 이하 목욕하고 증조고비(曾祖考:사자에게는 祖考)의 위패를 대청 북쪽에 남향하여 놓고 사자의 위패는 동쪽에
서향하여 놓은 다음 음식을 진설하고 제사지낸다.
소상은 초상으로부터 13개월 만인 초기일(初忌日)에 거행하는 상례이다.
연제(練祭)라고도 하며 주인 ·주부가 각각 연복(練服)을 입는다.
대상(大祥)은 초상으로부터 25개월 만인 재기일(再忌日)에 거행한다.
만일 부친이 생존하는 모친상일 경우에는 소상을 11개월 만에 거행하고 대상을 13개월 만에 거행한다.
소 ·대상의 월수 계산에는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이 끝나면 신주를 가묘 내의 동쪽에 서향하여 봉안하고 문을 닫는다.
이때 복의가 있으면 궤에 넣어 묘내(廟內)에 두고 영좌와 여막은 철거한다.
상장(喪杖)은 잘라 버리고 질대(帶)와
방립(方笠)은 불태워 버리며 상복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
|
|
 |
| |
담제는 대상을 지낸 다음다음 달 거행하는 상례로 그 전달 하순에
복일(卜日)한 것을 미리 가묘에 들어가 당위(當位:新主)에게 고한다.
담제 때는 주인 ·주부가 담복(服)을 착용한다.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 달에 거행하는데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복일(卜日)하여 지낸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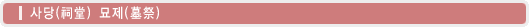 |
| |
사당은 4대조의 신주를 봉안하는 가묘이다.
3년상을 마친 뒤에는 신주를 사당으로 모시는데 사당은 4감(龕)을 설치하고 북쪽에 남향하여 서쪽부터 제1감은
고조고비(高祖考), 제2감은증조고비(曾祖考), 제3감은 조고비, 제4감은 고비(考)의 위가 된다.
|
|
|
| |
 |
|
| |
<사당 참례>
① 진알(晨謁) : 매일 이른 아침 주인이 의관을 갖추고 대문(사당 대문) 안에서 2번 절하되 3년
상기에는 하지 않는다.
② 출입고(出入告):주인이 출타하여 몇날 묵게 되면 출발전 대문 안에서 2번 절하고 귀가 후에도
그렇게 한다.
만약 몇 달을 묵으면 중문 안에서 분향재배하고 귀가 후에도 또한 같이 한다.
③ 참례(參禮)는 흔히 차례(茶禮)라고도 한다.
|
|
|
| |
 |
|
| |
⊙ 참례의 종류 |
|
| |
삭일참례
(朔日參禮) |
매월 음력 초하룻날 주인 이하 옷을 갈아입고 각 위에 음식을 진설한
다음 모사(茅沙)를 향상(香床)에 놓고 제사지낸다. |
망일참례
(望日參禮) |
매월 음력 보름날 분향재배한다. 모사는 베풀지 않는다. |
| 속절(俗節) |
정월 초하루·상원(上元:정월 보름)·중삼(重三:3월 3일)·단오(端午:5월 5일)
·유두(流頭:6월 望日)·칠석(七夕:7월 7일)·중양(重陽:9월 9일)·동지(冬至)에는 삭일참례와 같이 하되 다만
그 계절의 음식을 더 차린다. |
| 천신(薦新) |
속절의 시식(時食) 외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이를 바치되 절차는 망일참례와 같다.
예를 들면 앵두·참외·수박·웅어·조기·뱅어·은어·대구·청어·동태 등이 새로 나오면 사당에 바쳤다가
내려서 먹는 것이다. |
| 유사고(有事告) |
새로 관직을 받거나 관혼(冠婚) 등의 일이 있으면 주인과 당사자가 함께 참례하되
그 예법은 삭일참례와 같다. |
|
|
|
| |
 |
|
| |
⊙ 가제(家祭)의 종류 |
|
| |
| 시제(時祭) |
시제는 사시(四時)의 중월(仲月)에 거행하는 것으로 대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낸다. 춘분 ·추분 ·하지 ·동지 또는 속절일(俗節日)을 택하여도 무방한다. |
| 이제(祭) |
계추(季秋:음력 9월)에 지내는 제사로, 전달 하순에 택일하여 사당에 고하고 절차는
시제와 같다. |
| 기제(忌祭) |
돌아가신 주기일에 지내는 제사로 흔히 대청에 진설하고 주인 이하가 사당에 들어가
2번 절한 다음 해당 주독(主)을 모시고 나와 교의(交椅)에 봉안하고 제사지낸 다음 다시 사당으로
환봉(還奉)한다. |
|
|
|
| |
 |
|
| |
⊙ 묘제(묘소에서 거행하는 상례)의 종류 |
|
| |
| 묘사(墓祀) |
3월 상순에 택일하여 친속묘(親屬墓), 즉 4대조 묘에서 거행하는 제사이다. |
| 세사(歲祀) |
10월에 택일하여 친진묘(親盡墓), 즉 4대조가 넘은 묘소에 한해 지내는 제사이다. |
| 절사(節祀) |
한식 혹은 청명과 추석에 상묘하여 간단히 지내는 제사로 친진묘에는 거행하지 않는다. |
| 산신제 |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이때는 향 ·모사는 없이 지낸다. 또 절사에도
산신제가 있으나 이는 절사의 진찬(陳饌)과 절차대로 행한다. |
| 유사고(有事告) |
새로 관직을 받거나 관혼(冠婚) 등의 일이 있으면 주인과 당사자가 함께 참례하되
그 예법은 삭일참례와 같다. |
|
|
|
| |
 |
|
| |
이상 상례에 해당하는 각 항목만을 나열하였으나 이는 오직 우리의 선인들이 지금껏 행하여온
상례의 대강이고, 지금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간략한 상례가 행하여지므로 옛 상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 하겠다. |
|
| |
